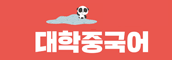우리는 고문서로 대변되는 방대한 기록문화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유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을 두고 자국의 방대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여, 역사서가 알려주지 못하는 과거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 서구의 국가들에 비하면 고문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아직 박물관 수장고를 벗어나지 못한 고문서들 위로 두텁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어 살피는 작업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일에 뛰어든 연구자들의 작업 성과를 모은 것이다. 문서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자잘한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부딪치면서 만들어 간 생활의 무늬를 고문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을 영남 각지의 수장고 속으로 흔쾌히 밀어 넣었다. 그리고 이들은 고문서 위에 쌓인 먼지 아래에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생생한 과거를 건져 올린다. <영남으로 가는 문서들>, <영남의 가정>, <영남의 향촌>, <영남의 관가>, <영남 밖으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각 부 내용을 통해 우리는 관직 임명, 사마방목 간행비용 독촉, 군적 자료, 세무자료, 관청 재물목록, 토목공사, 대민교육 등 공적인 내용뿐 아니라 향촌 지치규약, 향약절목 등 지방자치규범, 그리고 재산상속, 청탁, 노비 매매, 외상 기록, 결혼, 혼수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래 수장고에 있던 고문서가 당대를 모두 증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흥미로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당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