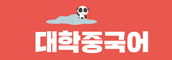이 책은 문학이 전통적인 수사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 내면의 동요를 표현하는지를 조명한다. 아동문학, 시, 소설, 영화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본 이런 새로운 언어는 매체의 변화와 관심의 변전 속에서 탄생한 문학 구조화의 한 방법이다. 그 새로운 언어는 감각적으로 상황을 기술하는 수사학적/정적 언어에서 벗어나, 상황에는 적절치 않으나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상상과 서스펜스로 가득 찬 언어이다.
내면의 수사학을 지향하는 작품들은 내러티브가 가지는 에토스와 표현보다는 내면의 감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개성을 보여 주며, 그런 상황을 구조화하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내면의 수사학은 아름다운 말재주를 겨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는 적절치 못하나, 그들이 보여주는 내적 동요가 독자와 관객을 압도하는 내러티브나 시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작품들에서 저자는 자신의 대가다운 목소리를 낮추고 독자나 관객들이 자신의 기억에서 무엇인가를 불러오도록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수용하는 데도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분석이 발견한 것들, 이미지의 대가들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기술과 철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환언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표현된 것’에 함의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근래 우리 문화산업의 빈곤으로 귀결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수사-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그런 문화는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예술과 환영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형식에 대한 상호 매체적 접근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책을 계기로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